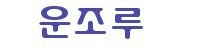[한국문화원] 김대벽 추모 사진전에 전시되는 전남 구례 운조루
운조루
0
182
2024.11.29 15:54
숭례문 화재로 목조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옥의 그윽한 아름다움을 담은 전시회가 열린다.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백안 김대벽 추모사진전―한옥의 향기'전은 2006년 타계한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백안(伯顔) 김대벽(金大璧·1929~2006)씨의 대표작 51점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다.
김씨는 함경북도 행영에서 태어나 한평생 한옥, 탈, 살림살이, 바위를 찍었다. 고건축 전문가인 신영훈(73) 한옥문화원장과 함께 무거운 카메라를 지고 전국을 돌며 사라져 가는 한국 문화의 원형을 기록했다. 이번 전시에는 살림집을 담은 작품 31점과 궁궐을 담은 작품 20점이 걸렸다. 전시장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대가의 생애를 한 발 한 발 쫒는 기분이 든다. 그것은 전북 익산 김해 김씨 고택을 출발해, 검은 기와에 긴 세월이 서리서리 내려 앉은 전남 구례 운조루를 지나, 광주 고경명 장군 종택의 단정한 툇마루를 바라보다가, 창덕궁, 경복궁, 종묘를 거닐고 나오는 여정이다.
김씨의 사진은 구도가 간결하다. 사람의 자취도 없다. 오래된 기와와 나무와 문풍지와 장독대와 대나무 밭뿐이다. 그런데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심성이 은은히 우러나온다. 김씨는 생전에 "사람은 없으되 사람 냄새가 나는 사진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산의 한 쪽이 삐뚜름하면 집을 똑바로 지을 경우 수평이 안되겠기에 집의 용마루도 산에 맞춰 한쪽을 조금 높여 짓는다"고 감탄한 그는 한옥에서 자연의 형세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한국인의 심성을 읽었다.
전시 기획에 참가한 사진작가 주명덕(68)씨는 "지금까지 한옥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가두어온 면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한국인의 정신세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